


|
계절이 오는 향기 | |||
| 지은이 : 이다인 (지은이) | ||||
| 출판사 : 책구름 | ||||
| 출판일 : 2023년 12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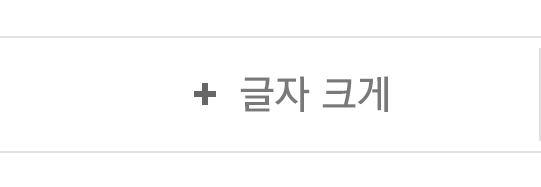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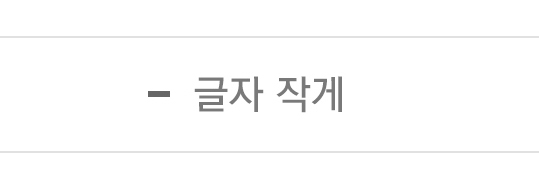 |
 |  |
■ 책 소개
육아를 하며 별을 본다
〈계절이 오는 향기〉는 자연과 시간, 우주에 관한 이야기다. 일반적인 육아 에세이처럼 보이지만 천체 관측이 취미인 저자의 시선은 모든 우주의 법칙들이 자연스레 아이에게로 향한다. 아이는 곧 하나의 작은 우주라는 저자의 이러한 견해는 출산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계절이 오는 향기〉에서도 일정 부분에서 육아의 고단함이 드러나면서 자칫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육아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따뜻하게 그려지며 육아의 밝은 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천체 관측이 취미였지만 아이를 가지면서 한동안 하지 못하던 저자는 실제 별을 보는 대신 아이라는 별을 관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아이 별’의 신비함을 따뜻한 글로 기록하였다.
“당분간 천체 관측을 갈 수 없겠지만 그토록 올려다본 별이 사람이 되어 내 속에 왔나 보다. 아득하게 먼 반짝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최선인 아름다운 동경 그 자체인 별이 나에게 왔다.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책을 읽게 되면 육아는 더 이상 육아의 영역으로 멈추지 않는다. 아이라는 작은 별, 우주를 길러내는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다.
■ 저자 이다인
대기과학과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고 별을 관측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졸업 직후부터 출산 전까지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엄마의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
떠오를 때마다 글을 쓰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과 할 일을 찾으려하는, 계절이 오는 향기를 알아채는 사람.
■ 차례
프롤로그 사계절처럼 적당하게 / 02
2015.04.02.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 / 13
2015.04.17. 백일 / 20
2015.06.04. 정이 깊어지는 거야 / 22
2015.07.03. 낮잠을 자고 난 뒤 / 26
2015.08.01. 7개월 이야기 / 28
2015.11.20. 캔디와 이유식 요정 이야기 / 37
2016.01.05. 첫 돌 / 40
2016.08.11. 엄마의 밥상 / 42
2016.09.08. 19개월 이야기 / 44
2016.09.16. 첫 사랑해 / 58
2016.10.20. 아기와 스파게티 / 60
2017.02.10. 애썼고 애쓴다 / 62
2017.03.10. 안아 / 66
2017.03.15. 어디든 가족이 있는 곳이 캔디의 집이야 / 68
2017.04.16. 사랑은 순간을 산다 / 70
2017.05.03. 간지러운 봄 / 76
2017.05.08. 아이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 / 78
2017.06.08. 느낌들 / 82
2017.06.12. 넌 왜 엄마 아빠 딸이 된 거야? / 85
2017.07.06. 여름에 예쁘다 / 86
2017.07.26. 여름 같은 여름 / 88
2017.08.05. 8월의 광안리 해수욕장 / 90
2017.08.06. 성지곡 수원지 / 93
2017.08.09. 사랑을 솔솔솔 / 96
2017.08.10. 아기를 기른다 심심하게 / 97
2017.08.14. 푸른 밤이 가는 시간 / 99
2017.08.19. 캔디와 무화과 / 100
2017.08.22. 포도 속의 여름 / 102
2017.09.12. 봄 여름 가을 겨울 / 108
2017.10.07. 천사와 1004일 / 112
2017.10.22. 32개월 이야기 / 113
2017.10.26. 미니사과 따기 / 126
2017.11.13. 어디든 가을은, 그러나 가을은 / 129
2017.11.27. 캔디와 신발 / 132
2017.12.01. 지금 눈이 와서 / 136
2017.12.04. 다시 좋은 겨울 / 140
2017.12.13. 슬픔은 무슨 뜻이야? / 142
2017.12.14. 그것 봐 예쁘지? / 144
2018.01.08. 사랑은 온다 / 146
2018.01.15. 아기는 노력한다 / 152
2018.01.22. 편안한 마음 / 154
2018.01.25. 말 잇는 아이 / 158
2018.01.30. 노을을 본다는 것 / 162
2018.02.12. 봄 느낌 여름 느낌 / 165
2018.02.18. 너라는 계절 / 167
2018.02.26. 소리 나는 빛 / 168
2018.03.01. 예쁘게 봐서 예쁘다 / 170
2018.03.13. 아기 별똥별 / 172
2018.03.15. 제철 사랑 / 174
2018.04.13. 아이의 바다 / 178
2018.04.16.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있어서 / 180
2018.04.18. 가닥 / 184
2018.04.19. 초록색 씨 큰 거 / 186
2018.04.20. 아침 생각 / 188
2018.04.25. 라일락 향기 / 192
2018.05.08. 햇빛 자리 / 194
2018.05.09.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 / 198
2018.05.11. 식사 만들기 / 200
2018.05.17. 다른 빠르기 / 203
2018.05.24. 아기야 / 206
2018.06.04. 불 같은 사랑 / 210
2018.06.11. 결국 나 / 211
2018.06.19. 올 첫 복숭아 / 214
2018.07.04. 커피 시간 / 216
2018.07.09. 안녕 / 219
2018.07.10. 7월 중 하루 / 220
2018.07.13. 긴긴낮 / 222
2018.07.19. 손톱 바람 / 227
2018.07.25. 달이 창에 들어오면 / 230
2018.07.31. 베란다 물놀이 / 232
2018.08.03. 마음이 간장 종지만 한 날 / 234
2018.08.31. 여름 숫자의 마지막 / 238
2018.10.09. 사랑 / 240
2018.10.16. 오늘을 자란 아이 / 241
2018.11.01. 엄마 김밥 / 244
2018.11.04. 캔디의 천체 관측회 데뷔 / 247
2018.12.01. 등 / 250
2018.12.06. 이제야 제일 예쁘다 / 254
2018.12.12. 네가 되는 시간 / 256
2018.12.13. 펑펑 눈 / 258
2018.12.18. 예쁜 여자 / 259
2018.12.19. 천천히 / 260
2018.12.20. 계절이 오는 향기 / 263
2019.01.16.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 / 266
2019.02.15. 시간을 느낀다 / 270
2019.03.22. 소중해 / 271
2019.03.28. 여행 같은 삶이 아니길 / 274
2019.03.29. 산딸기 열개 / 276
2019.04.08. 눈 속 우주 / 280
2019.05.06. 목욕탕에서 / 281
2019.07.22. 여름 단편 / 286
2019.08.20. 얼음 소리 / 289
2019.09.10. 집에서 와인 담기 / 291
2019.09.13. 땅콩 씻기 / 294
2019.11.18. 떼어놓는다는 것은 / 296
2019.12.31. 제일 예쁜 나이 / 298
2020.01.01. 달빛은 / 299
2020.03.11. 취향이란 / 301
2020.05.12. 꽃 리어카에서 꽃을 산다 / 308
2020.05.22. 아이 같은 나날 / 311
2021.03.06. 수박이 있는 밤 / 314
2021.06.04. 여름의 문턱 / 317
2021.09.23. 양배추 속 행복 / 319
2022.01.27. 저녁 8시 20분 / 322
에필로그 네가 있어 지구에 남기로 했다 / 324
 |  |
 |

시간의 흐름을 섬세한 감각으로 인식하는 이다인 작가가 자신의 육아 과정을 계절의 흐름과 연결지어 풀어냅니다. 우주 속에 살아가는 개인과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섬세하고 따듯하게 펼쳐집니다.

계절이 오는 향기
2015.06.04. 정이 깊어지는 거야 엄마가 자식을 품는 일은 당연할까? 아기가 밤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기가 놀다 남긴 흔적을 치운다. 거실에 나와 보면 아기가 놀고 난 모든 이야기가 보인다. 조막만 한 손으로 잡고 두드리고 했던 장남감들, 혼자 사생활을 즐겼던 소파 구석자리와 텔레비전 장옆, 재미나서 꺄르르 웃었던 그 모든 자취를 볼 때마다 오늘 하루도 아기는 행복하고 재미있었겠구나 싶어 흐뭇해진다.
잠이 들기 전 낯선 느낌에 저항하기 위해 작은 몸을 파닥이며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를 한껏 웅크려 안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했지 우리 아가, 내일 또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해 잘자”라고 진심을 담아 몇 번이고 속삭이며 다독였다. 이윽고 잠든 아가를 눕히고 쉿쉿 소리를 내며 깊고 편하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마지막 키스를 해주고 나면 왠지 모를 짠함에 속이 먹먹하다.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이 울음이란 걸 생각하면서도 성인인 나의 감정을 이입해 덩달아 아직도 눈물이 난다.
우리 할미도 우리 엄마도 우는 캔디를 보면 그냥 마음이 미어진다는데 나도 그렇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 캔디이지만 그래도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이 지금의 새로운 내 모습이다. 할미도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도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고 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 작은 아기는 얼마나 나와 떨어지기 싫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지금 캔디를 스치고 지나간 건 바람이라는 거야. 너가 눈을 찡긋하도록 만드는 게 햇빛이라는 거야.” 뭔가를 아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웃는 캔디를 보고 벌써 출산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애잔함이 자꾸 남아 오늘 엄마에게 물었다.
“정이 계속 깊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단다. 이 애잔함이 계속해서 짙어진단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어린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길, 적어도 그들의 유년기는 완벽히 행복하길, 가난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아기의 숨소리가 듣기 좋고 지금 속한 온 세상 구경하느라 바쁜 머리칼 다 빠진 뒤통수가 사랑스럽다.
당분간 천체 관측을 갈 수 없겠지만 그토록 올려다본 별이 사람이 되어 내 속에 왔나 보다. 아득하게 먼 반짝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최선인 아름다운 동경 그 자체인 별이 나에게 왔다.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할미는 캔디가 너무 예뻐 달에서 왔다고 했다. 나의 엄마는 정답은 없지만 진심을 다해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치는 한마디에 가벼운 따뜻함과 사랑을 담아.
2017.08.19. 캔디와 무화과 끝 여름의 신선한 무화과 몇 개쯤은 캔디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순식간에 다섯 개를 쭉쭉 먹고는 “엄마 무화 더 있어? 우리 냉장고에 무화 많지? 무화 있던데!” 이렇게 말하고는 좋을 때 호탕한 웃음을 꼭 들려준다. 기대에 차고 행복이 간지럽힐 때 웃는 털털하고 시원한 맛의 웃음이다. 이 웃음에는 가끔 ‘꼬소한 맛이 나기도 한다. 나는 어릴 때 무화과가 예쁜지도 맛있는지도 몰랐다. 몸이 어른이 되고서야 꽃인지 열매인지, 이 묘한 과일이 기분과 몸에, 맛에 이롭다는 걸 알았다. 신선한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부지런히 사다 먹일 생각에 마음이 푸지다. 그리고 무화과를 무화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귀여워서 정정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
2018.01.30. 노을을 본다는 것 대기에 미립자들이 만들어내는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색들은 감상하기에 좋다. 넘어가는 해와 대기는 순간순간 환상적인 색을 만들어내고 우린 넘어가고 있는 비스듬한 현재의 시간을 아쉬워한다. 오늘 하루였든 몇 해 전이었든 간에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을 생각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혹은 안타깝게 여긴다.
과거를 다시 궁금해하고 회상하고 새긴다는 것, 사진으로 찍고 글로 남기는 것 자체가 노을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아이를 낳게 되면 언제의 하루는 예뻐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 꼭 있는데 그날 밤 잠든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 노을을 본다. ‘오늘 이랬는데... 하며 넘어가는 하루 해를 잡아보고 싶어 한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이 더욱 아름답다. 매일이 아름다운 노을이진 않고 뿌연 하루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쌓은 하루하루를 엮어보면 아름답고 맑았다. 대부분 그러했다.
2018.02.12. 봄 느낌 여름 느낌 추위가 좀 가셨나? 즐거운 겨울이 지나고 있다. 즐거운 이벤트가 있었다기보다 눈이 올 때마다 쪼르르 달려나가 눈을 만지고 놀던 딸아이가 생각이 자꾸 나서다. 시간은 즐겁든 슬프든 가고 봄의 시간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어느새 찬 겨울밤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내내 문을 열어두는 베란다 창문을 잘 시간쯤 닫으려고 했을 때 “아!”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내 코에 봄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아직 땅은 꽁꽁 얼었고 들이쉬는 숨이 시림에도 공기에 봄 냄새가 났다. 집 바로 앞엔 산이라 부르기에 애매한 늙은 낮은 구릉이 있는데 분명 그 구릉 틈바구니에 봄 냄새를 몰고 오는 작은 생명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어떤 날은 종근이 출근하고 딱히 바쁜 일이 없던 9시 30분쯤 캔디와 깨서 아침 웃음을 나눌 때, 그땐 계절에 상관없이 습기가 미처 몰려오지 못한 6월 초의 어느 날 같았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함께 있는. 사브락거리는 면 이불에 우리의 체온이 남아 따뜻한데, 이제 나이가 차 제법 얌전히 자는 나와는 달리 이리저리 한창 크느라 잘 때도 활달한 우리 꼬마가 차낸 이불 덕에 삐져나온 발끝이나 등이 조금 시원한 느낌.
너는 걱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예쁜 내 딸이다. 6월 하늘의 구름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나의 맑은 하늘이다. 사계절을 모두 지낼 만하다. 지금보다 내가 더 어릴 적엔 무조건 무조건 여름에 목말라했다.
추울 때 코끝 시리며 종근 손안에 내 손을 둥글게 말아 넣고 같이 걷는 것이 좋다. 가을에 색이 변한 잎에 대해 캔디가 짓는 동화를 듣는 것도 좋다. 그저 우리의 이 시간이 아까워서 안타까울 뿐이다. 내 안엔 우리 덕분에 봄 느낌 여름 느낌이 항상 가득하다. 순간 드는 감정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더 개운하다. 가슴에 맴돌던 것이 눈으로 보인다.
2018.04.25. 라일락 향기 네 번째 봄. 네 번째 라일락, 나에게는 서른 네 번째의 라일락일지라도 우리에겐 네 번째다. 연보라색 라일락 나무 무리에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그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구경하려 했지만 “안녕 야옹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가버린 흰 고양이를 다시 그곳에서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온 봄엔 사랑표 모양의 작은 잎들이 돋더니 하얀 라일락이 피었다.
실은 그 연보라색 라일락 나무를 짧게 베어버려 올해는 못 보나 했다. 보라색이 주는 차분함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노곤하고 달콤한 향이 더해지면 그 자그마한 네 꽃잎을 가진 통꽃이 빛나는 것 같다. 아기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높이에 있어 코를 대고 들숨에 맡아야 하는지 날숨에 맡아야 하는지 모를 만큼 아기 때도 웃으며 꽃에 볼을 부볐다. 바람이 불면 더 명확히 향이 났다. 꽃도 바람을 이용하나 보다. 윙윙 벌 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조심히 꽃 옆을 맴돌았다. 만지고 부비고. 예쁜 모습에 향기로운 향까지 완벽한가 했지만 아이의 말이 더해져 그 찰나가 완성되었다.
“엄마 냄새 나. 꽃잎 냄새.”
꽃잎 냄새가 나에게 난단다. 아이는 온갖 좋은 것의 모음 같다.
2018.07.13. 긴긴낮 여름은 태양에서 지구가 가장 멀어지는 시기이지만 가장 빛난다. 공기에도 습기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끔은 숨을 막히게 한다. 탄산음료처럼 청량감이 느껴지지 않는 날씨이지만 보기만은 시원하다. 청량하다. 여름 하늘색은 자꾸 가던 길을 멈추고 땀 흘려가며 올려다보게 한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탁 트인, 내가 원하는 어디론가 와 있는 느낌이다.
어깻죽지에는 가방을 메고 고양이 발 같은 아이 손을 잡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방을 바로 잡으려는 찰나도 아이는 손을 못 놓게 한다. 가끔 귀찮다. 혼자 걷고 싶다. 그래도 다시 손을 잡고 싶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부모들은 알겠지.
뒤척이는 여름밤에도 아이는 나를 찾아 온 침대를 돌아다닌다. 자신의 몸 어딘가가 내 살에 닿아야 한다. 너른 침대 끝은 내 차지고 나머지는 모두 그 애의 차지다. 언제쯤 아이를 놓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꿈결이 거친 날에는 새벽에 깬 채 심장이 두근거려 괜히 자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고 볼을 쓰다듬고 품에 안아본다. 잘 자고 있는 데도 잘 자는지 확인한다. 이젠 기르고 싶다는, 조금 긴 머리칼을 천천히 넘겨주며 자고 있는 아이에게 말한다.
“아고 내 새끼, 아고 예쁜 것, 아이구 귀한 것, 우리 새끼 예쁘다. 잘자라 사랑한다.”
매 성장의 커트라인을 만들고 나면 꼭 지켜지지 않는다. 네 살의 어린이집, 세 살의 따로 재우기는 모두 생각 같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를 자꾸만 보듬으려 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그만 보듬으라는 소리가 들린다.
네 살은 어리다. 열 살도 어리다. 미운 네 살이란 단어는 틀렸다. 이렇게 어여쁘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바르다. 오늘은 내가 커피를 마시다 왕창 쏟았는데 얼른 휴지를 가져와 닦고 컵에 빨대를 꽂아 내게 주었다. 안 미끄러지게 줬다며 뿌듯해했다. 아이는 날 혼내지 않았다. 먹다가 흘려도 괜찮다고 했다. 아직도 실수하는 나는 네 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단 생각이 퍼뜩 들었다. 운전하다 욕이 튀어나와도 카시트에 앉아 “그러지 마 나쁜 말이야”라고 할 뿐이다. 하루에 수천 번 부르는 “엄마.” 소리가 낯선 듯 당연하게 들린다.
긴긴 낮은 아이와 할 것이 많다. 엄마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이 집엔 셋이 살기 때문에 셋 다 일을 해야 한다고 늘 가르친다. 빨래를 개고 옮기고, 먹은 것 정도는 스스로 싱크대에 넣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사는 것이라 가르친다. 그러고는 가장 더울 때를 넘겨 밖으로 나간다.
산책하고 강아지풀을 뜯는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핏덩이만을 위해 벌벌 떨면서 보냈던 하루들이 가상해 지금까지 왔다. 네 살이 된 지금 밥 한 술 편히 뜨느냐? 아니다. 아직은 아이에게 가야 할 손길의 시간은 할 일 많은 여름의 긴긴 낮 시간처럼 길기만 하다.
우리 아이의 밤잠 시간은 낮잠을 건너뛴 날은 저녁 7시다. 여름 나날의 저녁 7시는 한창 뛰놀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
“내 눈에 해가 있는데 왜 자요? 더 놀래!”
눈에 해가 있다네.
“아가, 여름은 그렇단다. 여름은 그래. 여름의 날들은 밤도 밝을 수 있어. 겨울은 반대이고. 저기 먼 어떤 곳은 여름밤 해가 지지 않는 곳도 있어. 그러니 자렴. 내일 아침에 또 놀자. 사랑해.”
그렇게 토닥이면 5분도 채 안 돼서 잠든다. 잠들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대변해준다. 아이가 잠들었어도 바깥은 밝다. 긴긴 낮 내 마음은 여름 구름처럼 몽실몽실하다. 기운 쎈 상승 기류 는 이렇게나 귀엽고 커다란 적운을 만들어준다. 이 모든 얘기를 뒤로하고 캔디의 컵에다가 구름을 담았다. 둘이서 창가에 앉아 구름, 컵, 눈의 순서로 조준을 해서 구름 아이스크림을 담았다. 마음으로 먹고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것이 긴긴 여름 낮의 단상이다. 콧잔등에 땀이 송송하면서 말이다.
2018.10.09. 사랑 맨발로 걸어보아라. 그늘진 땅에 있는 흙은 어떤 느낌인지 밟히는 작은 지구 부스러기들이 어떤 느낌인지. 손에 닿는 풀잎이 나란히맥인지 그물맥인지 자세히 보려무나. 대신 재미로 뜬지는 말아라. 비가 오고 난 뒤 숲의 미생물들은 더 짙은 향을 뿜으니 네가 좋다면 감기에 걸렸어도 그 찬 공기를 들이마셔 보아라. 우린 건강하니 너무 싸맬 필요는 없다.
넘치는 에너지를 맨땅과 나누고 누워서 보는 하늘과도 나누어라. 우리는 작은 너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크기의 우주가 있음에 기쁘다. “하늘 예쁘다”라고 말하는 네가 무척 자랑스러워 사랑스럽다. 어느 정도의 행복은 분명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깨끗한 흙을 밟고 식물과 곤충의 이름을 아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2018.12.06. 이제야 제일 예쁘다 처음 첫 순간에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땐 이상했다. 엄마가 될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고 임신을 한 순간이 엄마가 되는 건지 낳은 순간이 엄마가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길러 보니 눈에 뭐가 씌였는지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피부색도 이마가 튀어나온 정도도 눈썹 결도 입 모양도 그렇다.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해서 ‘제일이라고 줄을 세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그렇다. 아, 오직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오직이다.
어릴 때 사진이 많은데 보고 또 봐도 재미있다. 사진은 책처럼 그 순간이 머물러 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과거의 그때 머물러 있다. 영원히 어리고 여리다. 우리 엄마는 내가 사진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더라. 다른 아이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예뻐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 내가 한 아이의 어미가 되기 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 ‘예쁨의 객관성으로 따지자면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네가 제일 예쁘다는 것은 오직 너뿐이라는 의미다. 자식이 예쁜 건은 누가 뭐래도 오직 그 아이만 보이고 그 아이만 예쁘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가 예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내가 그래 예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니 그냥 쪼끄만 사람이구만…. 했던 생각이 수긍으로 바뀌었다. 오래된 사진 속내엄마 곁에 누운 핏덩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오직이였다.
2018.12.20. 계절이 오는 향기 계절이 오는 향기. 그 향기를 맡는 순간은 내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손에 꼽히는 일이다. 1년 살이 중 사계절이 바뀔 때나 또는 맑은 날엔 계절의 향기가 난다. 창을 열고 숨을 들이마신다. 원하는 향기가 날 땐 저절로 웃음이 난다.
아주 어릴 때 엄마에게 “엄마, 여름 냄새가 나. 여름이 왔나 봐.” “엄마, 눈 구름 냄새가 나. 눈이 올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많다. 엄마는 그때마다 엄마도 느껴진다고 계절마다 향기가 난다고 했다. 기쁜 대답이었다.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문득 창밖으로 학교 뒤 숲을 보면서 친구에게 봄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친구는 그런 느낌은 있고 냄새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때 계절이 오는 향기를 모두 맡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에게 오는 감정들은 계절이 오는 향기 같다. 아마도 이 향기에 기뻐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같지 않지만 그 즈음 비슷한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계절이 오는 향기는 아주 특별하다. 새로운 기쁨과 설렘을 준다. 여기서 오는 설렘은 오롯이 나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커다란 감정이다. 누군가 이 기분을 또 알까 싶다가도 너무 특별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 여름에 유리컵 속 냉커피를 저을 때 얼음이 달그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좋다. 일종의 여름만의 깨끗한 청량함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무언가에 비교할 수 있을까. 계절을 즐기다 보면 신기하게 아이가 큰다. 계절이 가면 또 아이는 커 있다. 소중한 이 감정은 내가 고이고이 아껴둔 내 마음속에 계절이 오는 향기다.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2015.06.04. 정이 깊어지는 거야 엄마가 자식을 품는 일은 당연할까? 아기가 밤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기가 놀다 남긴 흔적을 치운다. 거실에 나와 보면 아기가 놀고 난 모든 이야기가 보인다. 조막만 한 손으로 잡고 두드리고 했던 장남감들, 혼자 사생활을 즐겼던 소파 구석자리와 텔레비전 장옆, 재미나서 꺄르르 웃었던 그 모든 자취를 볼 때마다 오늘 하루도 아기는 행복하고 재미있었겠구나 싶어 흐뭇해진다.
잠이 들기 전 낯선 느낌에 저항하기 위해 작은 몸을 파닥이며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를 한껏 웅크려 안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했지 우리 아가, 내일 또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해 잘자”라고 진심을 담아 몇 번이고 속삭이며 다독였다. 이윽고 잠든 아가를 눕히고 쉿쉿 소리를 내며 깊고 편하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마지막 키스를 해주고 나면 왠지 모를 짠함에 속이 먹먹하다.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이 울음이란 걸 생각하면서도 성인인 나의 감정을 이입해 덩달아 아직도 눈물이 난다.
우리 할미도 우리 엄마도 우는 캔디를 보면 그냥 마음이 미어진다는데 나도 그렇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 캔디이지만 그래도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이 지금의 새로운 내 모습이다. 할미도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도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고 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 작은 아기는 얼마나 나와 떨어지기 싫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지금 캔디를 스치고 지나간 건 바람이라는 거야. 너가 눈을 찡긋하도록 만드는 게 햇빛이라는 거야.” 뭔가를 아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웃는 캔디를 보고 벌써 출산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애잔함이 자꾸 남아 오늘 엄마에게 물었다.
“정이 계속 깊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단다. 이 애잔함이 계속해서 짙어진단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어린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길, 적어도 그들의 유년기는 완벽히 행복하길, 가난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아기의 숨소리가 듣기 좋고 지금 속한 온 세상 구경하느라 바쁜 머리칼 다 빠진 뒤통수가 사랑스럽다.
당분간 천체 관측을 갈 수 없겠지만 그토록 올려다본 별이 사람이 되어 내 속에 왔나 보다. 아득하게 먼 반짝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최선인 아름다운 동경 그 자체인 별이 나에게 왔다.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할미는 캔디가 너무 예뻐 달에서 왔다고 했다. 나의 엄마는 정답은 없지만 진심을 다해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치는 한마디에 가벼운 따뜻함과 사랑을 담아.
2017.08.19. 캔디와 무화과 끝 여름의 신선한 무화과 몇 개쯤은 캔디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순식간에 다섯 개를 쭉쭉 먹고는 “엄마 무화 더 있어? 우리 냉장고에 무화 많지? 무화 있던데!” 이렇게 말하고는 좋을 때 호탕한 웃음을 꼭 들려준다. 기대에 차고 행복이 간지럽힐 때 웃는 털털하고 시원한 맛의 웃음이다. 이 웃음에는 가끔 ‘꼬소한 맛이 나기도 한다. 나는 어릴 때 무화과가 예쁜지도 맛있는지도 몰랐다. 몸이 어른이 되고서야 꽃인지 열매인지, 이 묘한 과일이 기분과 몸에, 맛에 이롭다는 걸 알았다. 신선한 무화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부지런히 사다 먹일 생각에 마음이 푸지다. 그리고 무화과를 무화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귀여워서 정정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
2018.01.30. 노을을 본다는 것 대기에 미립자들이 만들어내는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색들은 감상하기에 좋다. 넘어가는 해와 대기는 순간순간 환상적인 색을 만들어내고 우린 넘어가고 있는 비스듬한 현재의 시간을 아쉬워한다. 오늘 하루였든 몇 해 전이었든 간에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을 생각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혹은 안타깝게 여긴다.
과거를 다시 궁금해하고 회상하고 새긴다는 것, 사진으로 찍고 글로 남기는 것 자체가 노을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아이를 낳게 되면 언제의 하루는 예뻐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 꼭 있는데 그날 밤 잠든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 노을을 본다. ‘오늘 이랬는데... 하며 넘어가는 하루 해를 잡아보고 싶어 한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이 더욱 아름답다. 매일이 아름다운 노을이진 않고 뿌연 하루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쌓은 하루하루를 엮어보면 아름답고 맑았다. 대부분 그러했다.
2018.02.12. 봄 느낌 여름 느낌 추위가 좀 가셨나? 즐거운 겨울이 지나고 있다. 즐거운 이벤트가 있었다기보다 눈이 올 때마다 쪼르르 달려나가 눈을 만지고 놀던 딸아이가 생각이 자꾸 나서다. 시간은 즐겁든 슬프든 가고 봄의 시간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어느새 찬 겨울밤 공기 속에 봄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내내 문을 열어두는 베란다 창문을 잘 시간쯤 닫으려고 했을 때 “아!”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내 코에 봄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아직 땅은 꽁꽁 얼었고 들이쉬는 숨이 시림에도 공기에 봄 냄새가 났다. 집 바로 앞엔 산이라 부르기에 애매한 늙은 낮은 구릉이 있는데 분명 그 구릉 틈바구니에 봄 냄새를 몰고 오는 작은 생명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어떤 날은 종근이 출근하고 딱히 바쁜 일이 없던 9시 30분쯤 캔디와 깨서 아침 웃음을 나눌 때, 그땐 계절에 상관없이 습기가 미처 몰려오지 못한 6월 초의 어느 날 같았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함께 있는. 사브락거리는 면 이불에 우리의 체온이 남아 따뜻한데, 이제 나이가 차 제법 얌전히 자는 나와는 달리 이리저리 한창 크느라 잘 때도 활달한 우리 꼬마가 차낸 이불 덕에 삐져나온 발끝이나 등이 조금 시원한 느낌.
너는 걱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예쁜 내 딸이다. 6월 하늘의 구름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나의 맑은 하늘이다. 사계절을 모두 지낼 만하다. 지금보다 내가 더 어릴 적엔 무조건 무조건 여름에 목말라했다.
추울 때 코끝 시리며 종근 손안에 내 손을 둥글게 말아 넣고 같이 걷는 것이 좋다. 가을에 색이 변한 잎에 대해 캔디가 짓는 동화를 듣는 것도 좋다. 그저 우리의 이 시간이 아까워서 안타까울 뿐이다. 내 안엔 우리 덕분에 봄 느낌 여름 느낌이 항상 가득하다. 순간 드는 감정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더 개운하다. 가슴에 맴돌던 것이 눈으로 보인다.
2018.04.25. 라일락 향기 네 번째 봄. 네 번째 라일락, 나에게는 서른 네 번째의 라일락일지라도 우리에겐 네 번째다. 연보라색 라일락 나무 무리에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그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구경하려 했지만 “안녕 야옹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 가버린 흰 고양이를 다시 그곳에서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온 봄엔 사랑표 모양의 작은 잎들이 돋더니 하얀 라일락이 피었다.
실은 그 연보라색 라일락 나무를 짧게 베어버려 올해는 못 보나 했다. 보라색이 주는 차분함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노곤하고 달콤한 향이 더해지면 그 자그마한 네 꽃잎을 가진 통꽃이 빛나는 것 같다. 아기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높이에 있어 코를 대고 들숨에 맡아야 하는지 날숨에 맡아야 하는지 모를 만큼 아기 때도 웃으며 꽃에 볼을 부볐다. 바람이 불면 더 명확히 향이 났다. 꽃도 바람을 이용하나 보다. 윙윙 벌 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조심히 꽃 옆을 맴돌았다. 만지고 부비고. 예쁜 모습에 향기로운 향까지 완벽한가 했지만 아이의 말이 더해져 그 찰나가 완성되었다.
“엄마 냄새 나. 꽃잎 냄새.”
꽃잎 냄새가 나에게 난단다. 아이는 온갖 좋은 것의 모음 같다.
2018.07.13. 긴긴낮 여름은 태양에서 지구가 가장 멀어지는 시기이지만 가장 빛난다. 공기에도 습기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끔은 숨을 막히게 한다. 탄산음료처럼 청량감이 느껴지지 않는 날씨이지만 보기만은 시원하다. 청량하다. 여름 하늘색은 자꾸 가던 길을 멈추고 땀 흘려가며 올려다보게 한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탁 트인, 내가 원하는 어디론가 와 있는 느낌이다.
어깻죽지에는 가방을 메고 고양이 발 같은 아이 손을 잡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방을 바로 잡으려는 찰나도 아이는 손을 못 놓게 한다. 가끔 귀찮다. 혼자 걷고 싶다. 그래도 다시 손을 잡고 싶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부모들은 알겠지.
뒤척이는 여름밤에도 아이는 나를 찾아 온 침대를 돌아다닌다. 자신의 몸 어딘가가 내 살에 닿아야 한다. 너른 침대 끝은 내 차지고 나머지는 모두 그 애의 차지다. 언제쯤 아이를 놓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꿈결이 거친 날에는 새벽에 깬 채 심장이 두근거려 괜히 자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고 볼을 쓰다듬고 품에 안아본다. 잘 자고 있는 데도 잘 자는지 확인한다. 이젠 기르고 싶다는, 조금 긴 머리칼을 천천히 넘겨주며 자고 있는 아이에게 말한다.
“아고 내 새끼, 아고 예쁜 것, 아이구 귀한 것, 우리 새끼 예쁘다. 잘자라 사랑한다.”
매 성장의 커트라인을 만들고 나면 꼭 지켜지지 않는다. 네 살의 어린이집, 세 살의 따로 재우기는 모두 생각 같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를 자꾸만 보듬으려 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그만 보듬으라는 소리가 들린다.
네 살은 어리다. 열 살도 어리다. 미운 네 살이란 단어는 틀렸다. 이렇게 어여쁘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바르다. 오늘은 내가 커피를 마시다 왕창 쏟았는데 얼른 휴지를 가져와 닦고 컵에 빨대를 꽂아 내게 주었다. 안 미끄러지게 줬다며 뿌듯해했다. 아이는 날 혼내지 않았다. 먹다가 흘려도 괜찮다고 했다. 아직도 실수하는 나는 네 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단 생각이 퍼뜩 들었다. 운전하다 욕이 튀어나와도 카시트에 앉아 “그러지 마 나쁜 말이야”라고 할 뿐이다. 하루에 수천 번 부르는 “엄마.” 소리가 낯선 듯 당연하게 들린다.
긴긴 낮은 아이와 할 것이 많다. 엄마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이 집엔 셋이 살기 때문에 셋 다 일을 해야 한다고 늘 가르친다. 빨래를 개고 옮기고, 먹은 것 정도는 스스로 싱크대에 넣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사는 것이라 가르친다. 그러고는 가장 더울 때를 넘겨 밖으로 나간다.
산책하고 강아지풀을 뜯는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핏덩이만을 위해 벌벌 떨면서 보냈던 하루들이 가상해 지금까지 왔다. 네 살이 된 지금 밥 한 술 편히 뜨느냐? 아니다. 아직은 아이에게 가야 할 손길의 시간은 할 일 많은 여름의 긴긴 낮 시간처럼 길기만 하다.
우리 아이의 밤잠 시간은 낮잠을 건너뛴 날은 저녁 7시다. 여름 나날의 저녁 7시는 한창 뛰놀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
“내 눈에 해가 있는데 왜 자요? 더 놀래!”
눈에 해가 있다네.
“아가, 여름은 그렇단다. 여름은 그래. 여름의 날들은 밤도 밝을 수 있어. 겨울은 반대이고. 저기 먼 어떤 곳은 여름밤 해가 지지 않는 곳도 있어. 그러니 자렴. 내일 아침에 또 놀자. 사랑해.”
그렇게 토닥이면 5분도 채 안 돼서 잠든다. 잠들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대변해준다. 아이가 잠들었어도 바깥은 밝다. 긴긴 낮 내 마음은 여름 구름처럼 몽실몽실하다. 기운 쎈 상승 기류 는 이렇게나 귀엽고 커다란 적운을 만들어준다. 이 모든 얘기를 뒤로하고 캔디의 컵에다가 구름을 담았다. 둘이서 창가에 앉아 구름, 컵, 눈의 순서로 조준을 해서 구름 아이스크림을 담았다. 마음으로 먹고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것이 긴긴 여름 낮의 단상이다. 콧잔등에 땀이 송송하면서 말이다.
2018.10.09. 사랑 맨발로 걸어보아라. 그늘진 땅에 있는 흙은 어떤 느낌인지 밟히는 작은 지구 부스러기들이 어떤 느낌인지. 손에 닿는 풀잎이 나란히맥인지 그물맥인지 자세히 보려무나. 대신 재미로 뜬지는 말아라. 비가 오고 난 뒤 숲의 미생물들은 더 짙은 향을 뿜으니 네가 좋다면 감기에 걸렸어도 그 찬 공기를 들이마셔 보아라. 우린 건강하니 너무 싸맬 필요는 없다.
넘치는 에너지를 맨땅과 나누고 누워서 보는 하늘과도 나누어라. 우리는 작은 너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크기의 우주가 있음에 기쁘다. “하늘 예쁘다”라고 말하는 네가 무척 자랑스러워 사랑스럽다. 어느 정도의 행복은 분명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깨끗한 흙을 밟고 식물과 곤충의 이름을 아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2018.12.06. 이제야 제일 예쁘다 처음 첫 순간에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땐 이상했다. 엄마가 될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고 임신을 한 순간이 엄마가 되는 건지 낳은 순간이 엄마가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길러 보니 눈에 뭐가 씌였는지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피부색도 이마가 튀어나온 정도도 눈썹 결도 입 모양도 그렇다.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해서 ‘제일이라고 줄을 세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그렇다. 아, 오직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오직이다.
어릴 때 사진이 많은데 보고 또 봐도 재미있다. 사진은 책처럼 그 순간이 머물러 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과거의 그때 머물러 있다. 영원히 어리고 여리다. 우리 엄마는 내가 사진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더라. 다른 아이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예뻐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 내가 한 아이의 어미가 되기 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 ‘예쁨의 객관성으로 따지자면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네가 제일 예쁘다는 것은 오직 너뿐이라는 의미다. 자식이 예쁜 건은 누가 뭐래도 오직 그 아이만 보이고 그 아이만 예쁘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가 예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내가 그래 예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니 그냥 쪼끄만 사람이구만…. 했던 생각이 수긍으로 바뀌었다. 오래된 사진 속내엄마 곁에 누운 핏덩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오직이였다.
2018.12.20. 계절이 오는 향기 계절이 오는 향기. 그 향기를 맡는 순간은 내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손에 꼽히는 일이다. 1년 살이 중 사계절이 바뀔 때나 또는 맑은 날엔 계절의 향기가 난다. 창을 열고 숨을 들이마신다. 원하는 향기가 날 땐 저절로 웃음이 난다.
아주 어릴 때 엄마에게 “엄마, 여름 냄새가 나. 여름이 왔나 봐.” “엄마, 눈 구름 냄새가 나. 눈이 올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많다. 엄마는 그때마다 엄마도 느껴진다고 계절마다 향기가 난다고 했다. 기쁜 대답이었다.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문득 창밖으로 학교 뒤 숲을 보면서 친구에게 봄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친구는 그런 느낌은 있고 냄새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때 계절이 오는 향기를 모두 맡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에게 오는 감정들은 계절이 오는 향기 같다. 아마도 이 향기에 기뻐하며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같지 않지만 그 즈음 비슷한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계절이 오는 향기는 아주 특별하다. 새로운 기쁨과 설렘을 준다. 여기서 오는 설렘은 오롯이 나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커다란 감정이다. 누군가 이 기분을 또 알까 싶다가도 너무 특별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 여름에 유리컵 속 냉커피를 저을 때 얼음이 달그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좋다. 일종의 여름만의 깨끗한 청량함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무언가에 비교할 수 있을까. 계절을 즐기다 보면 신기하게 아이가 큰다. 계절이 가면 또 아이는 커 있다. 소중한 이 감정은 내가 고이고이 아껴둔 내 마음속에 계절이 오는 향기다.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