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앤티크 그릇 이야기 | |||
| 지은이 : 그릇 읽어주는 여자 김지연 (지은이) | ||||
| 출판사 : 몽스북 | ||||
| 출판일 : 2024년 02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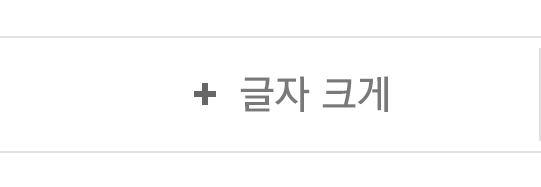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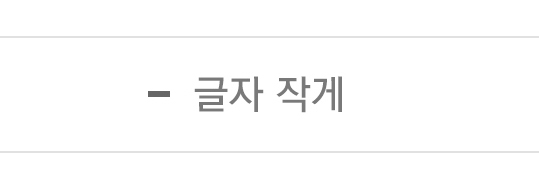 |
 |  |
■ 책 소개
입문자부터 고수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책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릇은 실제로 저자가 보유하며 사용하는 것들로 그릇의 역사와 브랜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특정 브랜드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흥망성쇠를 이루었는지 탄생 비화를 설명하고 패턴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토리를 소개한다. 또한 브랜드와 패턴을 읽어주는 중간중간 앤티크 그릇을 통해 맺어진 특별한 인연 등의 인간적인 스토리와 그릇 정보를 얻는 방법, 입문자를 위한 조언 등 다년간 축적된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더불어 앤티크와 빈티지의 정의, 앤티크 그릇 관리법, 백마크 보는 방법, 가품 구별법, 앤티크 그릇 용어, 그릇의 형태에 따른 명칭 등 앤티크 그릇의 기본기를 아낌없이 공유한다.
■ 저자 김지연
무용단 단원으로 해외 공연을 다니던 20대 시절, 공연을 마친 동료들이 옷을 사고 기념품을 살 때, 오래된 도시의 골목골목을 혼자 누비며 그릇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부족해 구입하지 못한 것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때를 기다렸고, 결혼 후 살림을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앤티크 그릇 수집가의 길에 들어섰다.
무용가로, 주얼리 사업가로 살면서도 해외 출장길 가방 안에는 늘 앤티크 그릇 한두 개가 들어 있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방문지 일순위는 현지의 박물관과 앤티크 마켓이었다. 30년간 이어진 그릇 공부와 컬렉팅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 〈그릇 읽어주는 여자〉는 앤티크 그릇 마니아들의 성지가 되었고, 누적 방문자 수는 140만 명을 넘었다. 평생 모은 그릇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한 ‘살롱 드 화려’ 티 클래스를 3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현재는 수백 명의 수강생들에게 ‘그릇과 홍차 이야기’라는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차례
목차
1 GERMANY
인간의 욕망이 낳은 유럽 최초의 도자기
마이센 Meissen 28
- 쿼터 포일 와토 Quarter Foil Watteau
- 웨이브 릴리프 Waves Relief
- 플라워 Flower
- 비폼 B-Form
- 쯔비벨무스터 Zwiebelmuster
각양각색 다채로운 스타일을 뽐내다
바바리아 Bavaria 44
- 아르츠베르크 Arzberg
- 티첸로히터 Tirschenreuth
- 발더스호프 장미의 기사 Waldershof Bavaria Rosenkavalier
- JKW 바바리아
- 바로이터 바바리아 Bareuther Bavaria
- 크라우트하임 Krautheim
마이센 도자기에 화려함을 입히다
드레스덴 Dresden 68
- 카를 티메 드레스덴 Karl Thime Dresden
- 천사 샬레와 네발 샬레 Porzellan Putten-Schale
- 레이스 피겨린 Lace Figurine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독일 대표 도자기
로젠탈 Rosenthal 82
- 상수시 Sanssouci
- 반호프 Bahnhof
시대를 초월한 다채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다
후첸로이터 Hutschenreuther 92
- 드레스덴 모리츠부르크 Dresden Moritzburg
- 마리아 테레지아 코부르크 Maria Theresia Coburg
합리적인 독일 그릇의 대명사
빌레로이앤보흐 Villeroy & Boch 98
- 파산 Fasan
- 아우든 Auden
- 디자인 1900 Design 1900
서독을 대표하는 명품 도자기
린드너 Lindner 108
- 프린세스 로즈 Princess Rose
- 마리 루이즈 슈펜 Marie Luise Schuppen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자기 브랜드
퓌르스텐베르크 Furstenberg 116
괴테가 예찬한 독일 도자기
바이마르 Weimar 120
독일스러우면서도 독일스럽지 않은 그릇
운터바이스바흐 샤우바흐쿤스트 Unterweiβbach Schaubachkunst 124
순도 백퍼센트 코발트 블루를 엿보다
리히테 Lichte 128
2 UNITED KINGDOM
영국 왕실이 사랑한 그릇
로열 크라운 더비 Royal Crown Derby 134
- 올드 이마리 1128 Old Imari & 트래디셔널 이마리 2451 Imari Traditional
- 아비스 시리즈 Aves & 올드 아비스버리 Olde Avesbury
- 코츠월드 Cotswold
영국 여왕과 국민이 사랑한 그릇
웨지우드 Wedgwood 146
- 바살트 Black Basalt
- 재스퍼 Jasper
- 퀸즈웨어 Queensware
- 플로렌틴 Florentine
- 애플도어 Appledore vs. 페어포드 Fairford
- 메들레인 Medeleine
- 비앙카 Bianca & 차이니스 플라워 Chinese Flowers
어머니들의 로망이었던 영국 그릇
앤슬리 Aynseley 164
- 오처드 골드 Orchard Gold
- 펨브로크 Pembroke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였던 영국 명품 도자기
콜포트 Coalport 170
- 배트윙 Batwing
- 밍 로즈Ming Rose
- 레벌리 Revelry
영국 대표 도자기가 된 후발주자
로열 덜튼 Royal Doulton 176
- 브램블리 헤지 Brambly Hedge
- 올드 콜로니 Old Colony
빈티지와 앤티크로만 만날 수 있는 영국 대표 도자기
크라운 스태퍼드셔 Crown Staffordshire 182
- 엘즈미어 Ellesmere
- F9213
장미 그릇의 대명사
로열 알버트 Royal Albert 186
- 올드 컨트리 로즈 Old Country Roses
- 올드 잉글리시 로즈 Old English Rose
- 세뇨리타 Senorita
영국 왕실이 품질 보증한 도자기
파라곤 Paragon 196
- 트리 오브 카슈미르 Tree of Kashmir
블루 윌로우 패턴의 대명사
부스 Booths 204
마니아층이 두터운 영국 도자기
셸리 Shelley 208
내 마음속 1등 영국 도자기
민튼 Minton 216
영국 포세린 꽃포지 티포트의 정수
로열 스트랏포드 Royale Stratford 220
3 IRELAND
아일랜드의 보석
벨릭 Belleek 226
- 넵튠 Neptune
- 뉴 셸 & 샴록 & 어니 & 림펫 New Shell & Shamrock & Erne & Limpet
4 DENMARK
명불허전 덴마크 대표 포슬린
로얄코펜하겐 Royal Copenhagen 236
- 블루 플루티드 Blue Fluted
- 플로라 다니카 Flora Danica
- 블루 플라워 앵귤러 Blue Flower Angular
- 팬 서비스 골드 Fan Service Gold 414
- 빙앤그렌달 Bing & Grøndahl
- 빙앤그렌달 크리스마스 로즈 Bing & Grøndahl Christmas Rose
- 이형 접시
5 AUSTRIA
오스트리아 여제가 만든 도자기
로열 비엔나 Royal Vienna 260
- 로열 비엔나 스타일 Royal Vienna Style
6 HUNGARY
헝가리의 소도시, 명품 도자기의 대명사가 되다
헤렌드 Herend 270
- 퀸빅토리아 Queen Victoria
- 로스차일드 Rothschild
- 아포니 Apponyi
- 티포트 모음
7 FRANCE
프랑스의 자존심
세브르 Sevres 288
프랑스 명품 도자기
지앙 Given 294
프랑스 명품 도자기의 고장
리모주 Limoges 298
- 하빌랜드 Haviland
- 지로&필 Giraud & Fils
- 프라고나르 명화 접시 Fragonard plate
8 ITALY
이탈리아의 자존심
리차드 지노리 Richard Ginori 308
- 라팔로 Rapallo
- 그란두카 코리아나 Granduca Coreana
9 RUSSIA
러시아의 국민 도자기
그젤 Gzhel 314
러시아 황실 도자기
로모노소프 Lomonosov 316
- 사모바르 모티브 디자인 Samovar Motives Design
- 코발트 넷
10 USA
백악관의 그릇
레녹스 Lenox 328
레트로 감성과 함께 다시 뜨는 그릇
밀크글라스 Milk Glass 334
알아두면 좋은 앤티크 그릇 정보 341
 |  |
 |

30년간 앤티크 그릇을 모으며 세계사와 서양 미술사에 이어 꽃이름까지 섭렵한 저자가 세계 앤티크 그릇의 탄생 비화와 패턴을 읽어줍니다. 로얄 크라운 더비, 쉘리, 웨지우드 등 국내에 잘 알려진 그릇 브랜드 외에도 저자의 안목으로 찾아낸 낯선 명품 그릇까지 두루 소개합니다.

나의 앤티크 그릇 이야기
GERMANY 인간의 욕망이 낳은 유럽 최초의 도자기 마이센 Meissen 유럽 최초 백자의 탄생 가방, 시계, 그릇 등의 명품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마이센은 소위 명품 도자기라고 일컫는 유럽 앤티크 그릇의 시초이기에 그릇쟁이에게 마이센 그릇을 보유한다는 것은 ‘나 그릇 좀 있는 여자야 혹은 ‘나 그릇 좀 아는 여자야와 동일시된다. 그만큼 가격도 독보적이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마이센은 마이(많이) 쎄(세).”라고 이야기할까.
마이센 도자기는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탄생 스토리는 그렇지 않다. 17세기 유럽은 중국 도자기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특히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중국 도자기를 ‘동양에서 온 금이라고 부르며 귀히 여겼고 이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유럽 상류 사회의 중국 도자기 사랑은 시누아즈리(chinoiserie) 트렌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시누아즈리는 프랑스어로 ‘중국풍, ‘중국 취향을 의미한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인 작센(Sachsen)의 선제후(독일 황제의 선거권을 가졌던 일곱 사람의 제후)로 폴란드 왕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 I)는 유명한 도자기 수집가였다. 미학적 취미를 충족시킬 겸 군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Johann Friedrich Böttger)를 작센의 주도인 드레스덴(Dresden)의 성 안에 감금시킨 후 도자기 개발을 명령했다. 뵈트거는 오랜 연구 끝에 유럽 최초의 백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1710년 아우구스트 1세는 드레스덴 근교 마이센에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마이센 도자기의 시작이다.
작품이 된 마이센 도자기 *명화가 된 그릇, 쿼터 포일 와토 Quarter Foil Watteau</P> 마이센의 그릇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마이센 그릇 대부분이 장식용이기에 용도가 그릇일 뿐 사실은 작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자주 들일 수는 없지만 가끔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것이 바로 마이센의 쿼터 포일 와토 시리즈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4개로 나뉜 패널에 절반은 도이치 블루맨Deutsche blumen 플라워를, 나머지 반은 장 앙투안 와토(Jean-Antoine Watteau)의 ‘와토 장면(Watteau szene: szene는 독일어로 장면, 풍경 등의 의미를 가졌다.)을 에나멜 페인트로 그려 넣었다.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는 전원이나 공원에서 우아한 복장으로 여유를 즐기는 남녀를 묘사한 페트 갈랑트 스타일을 만든 주인공으로 루이 15세 통치 시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장식적이고 화려한 미술 양식인 로코코(Rococo) 양식의 대가로 꼽힌다.
당시 작센의 왕은 여름 별장을 모두 와토의 그림으로 장식할 만큼 와토 장면이 들어간 그림에 크게 매혹되었는데 1740년대 마이센에서는 11명의 소속 화가들에게 와토 장면을 넣은 도자기를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1749년 작센 왕가에 헌정된 그린 와토 서비스(Green Watteau Service, 서비스는 ‘세트(set)를 의미한다.)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마이센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보유 중인 쿼터 포일 와토 접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군데군데 페인팅이 벗겨지고 수리한 흔적 때문에 마이센 진품치고는 값이 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앤티크 그릇의 가치를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앤티크 그릇을 수집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독일에 사는 지인이 기념으로 하나씩 갖자며 선물한 것으로 그 어떤 명품 그릇보다 나에겐 의미 있는 그릇이다. 원 4개가 한데 모여서 만들어지는 무늬인 쿼터 포일은 건축 양식이나 장식 예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로 네잎클로버를 생각하면 된다. 쿼터 포일 와토 접시가 나에겐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마이센 도자기에 화려함을 입히다, 드레스덴 Dresden 드레스덴 그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 마이센과 자주 혼동되는 드레스덴 도자기. 그도 그럴 것이 드레스덴에서 채색한 도자기의 베이스는 마이센의 백색 도자기였고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에는 마이센의 백 마크를 같이 사용하기도 했었다. 드레스덴의 초기 백 마크인 AR 마크와 파란 쌍검 마크는 1886년 마이센의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이후 드레스덴은 알파벳 D와 크라운 마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채색 작가들에겐 어떤 백 마크를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헬레나 볼프존도 마이센의 AR 마크를 사용하다가 마이센과의 소송에서 패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마이센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이니 마이센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후대에 사람들이 도자기의 가치를 물질적인 잣대로 평가하면서 브랜드명, 생산 연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는 제품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근본은 마이센과 같지만 각 작가의 개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드레스덴 도자기를 그릇 수집가의 입장에서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솔직히 앤티크 그릇 마켓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마이센의 대용품으로서 그릇쟁이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드레스덴을 이야기할 때 ‘마이센 대신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마이센이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이 문을 열면서 유명해진 도시라면, 독일의 예술·문화의 중심지였던 드레스덴은 이미 완성형 도시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실력파 작가들이 크고 작은 채색 공방을 열어 자신만의 예술성을 확립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드레스덴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자기 브랜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센터피스, 천사 샬레와 네발 샬레 Porzellan Putten-Schale 학창 시절, 과학 실험실에서 한 번쯤 봤던 샬레(schale)는 독일어로 움푹 팬 접시,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드레스덴 그릇을 보다 보면 ‘네발 샬레, ‘천사샬레라는 이름을 종종 듣게 되는데 특정 브랜드나 라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릇의 형태를 부르는 말로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릇을 생산하고 있는 카를 티메 드레스덴의 SP 드레스덴 백 마크를 가진 천사 샬레는 크기별로, 스타일별로 모두 갖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릇이다. 드레스덴 카를 티메의 가장 큰 특징인 화려한 꽃 장식과 색채, 골드 장식이 이 샬레에서도 잘 드러나며 로코코와 바로크,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장식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샬레를 받치고 있는 세 명의 아기 천사인 푸토(putto, 아기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는 빨간 볼과 포동포동한 살집이 귀엽게 잘 묘사되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 봉봉 볼(bonbon bowl)처럼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을 담아 식탁 위에 센터피스 삼아 놓으면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독일의 여느 가정집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그릇이 주는 힘이 아닐까. 보유 중인 또 다른 샬레는 다리가 네 개 달려 있고 푸토와 꽃까지,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그릇을 뒤집어 보면 아래쪽 디테일도 좋아서 세웠다가 뒤집었다가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질리지 않는다. 다만 꽃 장식이 섬세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발이 달려 있어 적층 보관은 힘들어 전용 그릇장에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드레스덴의 마스터피스, 레이스 피겨린 Lace Figurine 마이센에서 1709년 경질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드레스덴 지역에는 도자기 공장은 없었지만 마이센 도자기를 장식하는 수많은 채색 공방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채색 공방의 예술가들이 애용하는 가장 유명한 기법 중 하나가 레이스 피겨린이었다. 피겨린(figurine)은 도자기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 인형을 뜻하며, 주로 테이블 위 센터피스로 사용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드레스덴의 도자기나 피겨린은 곧 마이센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실제로 정교하게 만든 레이스 피겨린 작품은 드레스덴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이 더 많다. 드레스덴은 유독 전쟁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므로 숨만 쉬어도 깨진다는 드레스 피겨린이 드레스덴에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외교 선물 등으로 유출되었던 제품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레이스 피겨린은 드레스덴 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직접 선물 받은 것이다. 높이가 각각 4cm, 7cm일 정도로 매우 작지만 그 어떤 대형 작품보다 나에게는 의미가 깊다. 레이스 피겨린을 직접 만들어본 후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알기에 이 작은 인형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레이스 피겨린 만드는 방법은 섬유 레이스에 흙물을 입히고 이 레이스를 한 땀 한 땀 주름을 잡아 인형에 붙인다. 꽃과 리본 등 디테일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시킨 후 1,200°C 이상 고온에서 구우면 섬유인 레이스는 모두 타고 흙물만 남는다. 1차 소성 후 유약을 바르고 얼굴을 그리는데 이건 더 어렵다. 작은 실수로도 레이스가 깨질 수 있으니 긴 붓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눈, 코, 입을 그려 넣어야 한다. 레이스 피겨린을 보면 얼굴 표정이 제각각이고 때로는 이목구비가 조금 ‘못생긴 인형을 만나기도 하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저 100년의 세월을 담담하게 견디고 레이스를 온전하게 지켜낸 ‘이 쪼꼬미들이 고마울 뿐이다.
UNITED KINGDOM 영국 왕실이 사랑한 그릇 로열 크라운 더비 Royal Crown Derby 어머니들의 로망이었던 영국 그릇 앤슬리 Aynseley 그릇에 무심했던 친정어머니의 그릇장에도, 그릇을 좋아했던 시어머니의 그릇장에도 존재감을 뽐냈던 그릇이 하나 있다. 강렬한 원색에 먹음직스러운 과일 문양이 돋보였던 앤슬리의 오처드 골드(Orchard Gold)가 그것. 1970~1980년대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의 영향으로 외국산 그릇이 국내에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화려한 앤슬리가 단연 눈에 띄었을 것이다. 국내 도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컬러와 패턴이었기에 더욱더 어머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그때 그 시절 어머니들의 마음을 훔친 앤슬리는 한 영국인의 취미에서 비롯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1700년대 영국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 지역 탄광의 회장이었던 존 앤슬리(John Aynsley)는 도자기 수집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점토공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1775년 롱턴(Lonton)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도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의 열정과 도자기 기술이 시너지를 내며 앤슬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존 앤슬리는 도예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아들인 제임스(James) 역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유지했으며 1861년 제임스 앤슬리의 아들인 존 앤슬리 2세(John Aynsley II)는 가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공정을 도입했다. 그는 50%의 석회화된 골재를 도자기에 넣어 더 강하고 더 하얀 ‘본차이나를 만들었다. 이러한 본차이나의 높은 품질은 독특한 패턴과 더불어 앤슬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앤슬리는 자국과 해외에서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후대에 더 사랑받는 앤슬리의 작가들 오리엔탈 감성의 티 세트, 펨브로크 Pembroke 펨브로크의 찻잔만 갖고 있는 시어머니께 티 세트를 만들어 선물할 목적으로 티포트, 커피포트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대가족이 되어버렸다. ‘그릇 운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운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변명이라면 변명이다.
앤슬리 펨브로크는 18세기 아시아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패턴으로 영국 펨브로크 지방의 도자기를 좋아하던 펨브로크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패턴은 컬러풀한 꽃무늬와 그릇의 중앙에 위치한 새가 특징인데, 그러고 보니 꽃과 새를 그린 우리나라 화조도(花鳥圖)와도 많이 닮아 있다. 전반적인 톤이 웨지우드 찬우드(Charnwood) 패턴과도 비슷한데 찬우드는 새가 아닌 나비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릇이 여러 개이다 보니 각각의 포트, 찻잔의 꽃과 새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DENMARK 명불허전 덴마크 대표 포슬린 로얄코펜하겐 Royal Copenhagen 로얄코펜하겐 심벌의 비밀 브랜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얄코펜하겐은 덴마크 왕실의 든든한 후원 아래 250여 년 동안 최고의 도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는 브랜드 로고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로고의 왕관 문양은 왕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왕관 아래 세 개의 물결무늬는 덴마크를 지나는 세 개의 해협을 의미한다.
엘레강스 스타일의 표본, 팬 서비스 골드 Fan Service Gold 컬렉터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희귀한 아이템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한 듯 혈압이 마구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좋아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입안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과도 비슷하다. 코발트 컬러 일색인 로얄코펜하겐 제품만 보다가 팬 서비스 골드를 처음 봤을 때 내 기분이 딱 그랬다.
팬 서비스는 로얄코펜하겐의 전설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아놀드 크록(Arnold Krog)이 디자인한 그릇으로 화이트, 블루, 골드 세 가지로 출시되었으며 그중 골드가 가장 상위 버전이다. 팬 서비스 골드는 그릇마다 3cm 정도 되는 두꺼운 골드 라인이 둘러져 있고, 커피포트와 찻잔의 손잡이에는 골드 리스가 장식되어 있어 그야말로 부티가 줄줄 흐른다. 다만 이러한 골드포인트는 무광 처리되어 ‘블링블링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은은한 럭셔리에 가깝다.
굳이 흠을 찾자면 전체 그릇 볼륨에 비해 손잡이가 너무 작다는 것. 유럽 차 문화에서는 찻잔을 잡을 때 손가락을 손잡이에 걸지 않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살짝 잡는 것이 올바른 에티켓이다.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에 찻잔 손잡이에 손가락을 거는 것이 마치 옆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처럼 보여서 이와 같은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백 마크를 보면 1969년에 생산된 것이며 리스 장식으로 추측하건대 크리스마스 디너용으로 출시된 것이 아닐까 싶다. 패턴명을 들으면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한 그릇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서비스(service)는 독일어로 식기 세트라는 의미이다. ‘팬 서비스이건 ‘팬 식기 세트이건 나 같은 그릇쟁이들에게 선물인 것만은 확실하다.
겨울에 피는 꽃, 빙앤그렌달 크리스마스 로즈 Christmas Rose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미당 서정주의 시를 노래한 가수 송창식의 목소리가 절로 생각나는 쨍한 파란색이 돋보이는 그릇이다. 제품명이면서 패턴의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로즈는 헬레보루스(helleborus)라고도 불리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눈장미 또는 ‘겨울장미 등의 애칭을 갖고 있다. 식물의 줄기와 잎은 로얄코펜하겐의 시그니처 컬러인 코발트블루로, 꽃잎은 입체감 있는 화이트 컬러로 표현했고 배경은 빙앤그렌달만의 그러데이션 채색 기법을 사용했다. 꽃만 봤을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지만 혹독한 추위에도 언 땅을 뚫고 나올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외유내강의 크리스마스 로즈를 로얄코펜하겐 스타일로 잘 해석했다는 생각이 든다. 청량한 컬러 때문인지 여름에 주로 애용하는 그릇인데 블루 컬러의 다른 라인 제품과 믹스앤 매치해도 잘 어우러진다.
FRANCE 프랑스의 자존심 세브르 Sèvres 마이센의 아성에 도전하는 세브르 유럽 경질 자기의 역사는 중국 청화 백자를 모방하면서 시작됐기에 푸른색을 좋아하는 내가 앤티크 그릇 수집가가 된 것은 필연이 아닐까 싶다.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 블루, 그중에서도 짙은 물빛의 푸른색, 바로 터키블루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는 세브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블루 셀레스트(bleu celeste)와 궤를 같이한다. 세브르 그릇은 나의 워너비 컬러 그 자체이므로 수집 리스트의 상단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워낙 고가여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 아이템이기도 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등 어느 나라 박물관을 가도 눈이 부시게 파란 터키블루의 세브르 그릇은 항상 있었다. 자꾸 보면 질릴까 싶어 파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밥 먹듯이 박물관을 드나들며 세브르 그릇에 눈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갈망이 더 커져 결국 내 그릇장을 채우게 됐다.
1709년 독일 작센 공국 마이센에서 경질 자기를 생산하던 시기에 프랑스 샹티이(Chantilly) 지방에서는 연질 자기인 파이앙스(faience)를 생산하고 있었다. 1740년 루이 15세(Louis Xv)와 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Jeanne Antoinette Pisson)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파리 외곽의 뱅센(Vincennes) 지역에 도자기 공장을 열면서 세브르의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이 제조소의 목적은 마이센에 필적하는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756년 공장을 세브르 지방으로 옮긴 후 세브르 국립 도자기 제조소(Manufacture nationale de Sèvres)로 이름을 바꿨고, 1768년 리모주(Limoges)에서 고령토를 발견해 1770년 이후 마침내 경질 자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경질 자기 개발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마이센보다 50년 이상 뒤처지긴 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로코코 양식을 세브르 도자기에 온전히 투영시킨 것을 보면 연질 자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던 프랑스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3대 도자기로 우뚝 서다 퐁파두르 부인의 미적 감각은 세브르 도자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특히 당대 유행하던 살롱 문화의 필수 아이템인 실내 장식용 도자기와 만찬용 식기 세트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왕실 제정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제작된 화병에서 황동 장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 장인들이기에 가능한 요소였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독일 도자기는 흰색 그릇에 패턴을 새긴 것이 전부였다면, 프랑스 자기는 발굽이나 황동 등의 장식을 더해 한껏 멋을 부렸다. 세브르의 트레이만 보더라도 몰딩 처리한 것처럼 황동 장식이 트레이의 가장자리에 빙 둘러져 있는데 얼마나 멋스러운지 모른다.
이처럼 세브르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 꽃 장식과 금장을 더한 다채로운 패턴, 유니크한 블루 셀레스트 컬러를 만들어내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세브르 도자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은 전원, 귀족들의 모습, 꽃, 새, 과일 등으로 화가 프랑수아 부셰(François Boucher), 조각가 오귀스탱 파주(Augustin Pajou) 등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로코코 양식의 대가가 대거 참여해 작품을 완성했다. 1800년 나폴레옹은 화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알렉상드르 브롱니아르트(Alexandre Brongniart)를 세브르의 감독으로 임명해 47년간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세브르 공장에서는 화병과 테이블 센터피스와 같은 큰 장식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외교 선물 용도였다.
한편 오늘날에도 세브르는 프랑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도제식으로 장인을 키우고 있으며, 도자기 페인팅을 하는 정식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세브르 공식 홈페이지(www.sevresciteceramique.fr/)가 박물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세브르 도자기가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판매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제작 중단과도 같은 것이기에 가격은 점점 더 높게 형성될 것이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점점 더 구하기 힘든 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은 ‘로또 일등에 당첨된다면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릇을 잔뜩 사야지. 하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그릇장 가득 세브르 그릇으로 채우는 상상도 해보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 세브르. 앤티크 그릇을 수집한 지 30년이 지나니 이러한 감정이 마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자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GERMANY 인간의 욕망이 낳은 유럽 최초의 도자기 마이센 Meissen 유럽 최초 백자의 탄생 가방, 시계, 그릇 등의 명품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마이센은 소위 명품 도자기라고 일컫는 유럽 앤티크 그릇의 시초이기에 그릇쟁이에게 마이센 그릇을 보유한다는 것은 ‘나 그릇 좀 있는 여자야 혹은 ‘나 그릇 좀 아는 여자야와 동일시된다. 그만큼 가격도 독보적이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마이센은 마이(많이) 쎄(세).”라고 이야기할까.
마이센 도자기는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탄생 스토리는 그렇지 않다. 17세기 유럽은 중국 도자기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특히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중국 도자기를 ‘동양에서 온 금이라고 부르며 귀히 여겼고 이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유럽 상류 사회의 중국 도자기 사랑은 시누아즈리(chinoiserie) 트렌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시누아즈리는 프랑스어로 ‘중국풍, ‘중국 취향을 의미한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인 작센(Sachsen)의 선제후(독일 황제의 선거권을 가졌던 일곱 사람의 제후)로 폴란드 왕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Friedrich August I)는 유명한 도자기 수집가였다. 미학적 취미를 충족시킬 겸 군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Johann Friedrich Böttger)를 작센의 주도인 드레스덴(Dresden)의 성 안에 감금시킨 후 도자기 개발을 명령했다. 뵈트거는 오랜 연구 끝에 유럽 최초의 백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1710년 아우구스트 1세는 드레스덴 근교 마이센에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마이센 도자기의 시작이다.
작품이 된 마이센 도자기 *명화가 된 그릇, 쿼터 포일 와토 Quarter Foil Watteau</P> 마이센의 그릇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마이센 그릇 대부분이 장식용이기에 용도가 그릇일 뿐 사실은 작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자주 들일 수는 없지만 가끔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것이 바로 마이센의 쿼터 포일 와토 시리즈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4개로 나뉜 패널에 절반은 도이치 블루맨Deutsche blumen 플라워를, 나머지 반은 장 앙투안 와토(Jean-Antoine Watteau)의 ‘와토 장면(Watteau szene: szene는 독일어로 장면, 풍경 등의 의미를 가졌다.)을 에나멜 페인트로 그려 넣었다.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는 전원이나 공원에서 우아한 복장으로 여유를 즐기는 남녀를 묘사한 페트 갈랑트 스타일을 만든 주인공으로 루이 15세 통치 시기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장식적이고 화려한 미술 양식인 로코코(Rococo) 양식의 대가로 꼽힌다.
당시 작센의 왕은 여름 별장을 모두 와토의 그림으로 장식할 만큼 와토 장면이 들어간 그림에 크게 매혹되었는데 1740년대 마이센에서는 11명의 소속 화가들에게 와토 장면을 넣은 도자기를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1749년 작센 왕가에 헌정된 그린 와토 서비스(Green Watteau Service, 서비스는 ‘세트(set)를 의미한다.)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마이센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보유 중인 쿼터 포일 와토 접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군데군데 페인팅이 벗겨지고 수리한 흔적 때문에 마이센 진품치고는 값이 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앤티크 그릇의 가치를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앤티크 그릇을 수집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독일에 사는 지인이 기념으로 하나씩 갖자며 선물한 것으로 그 어떤 명품 그릇보다 나에겐 의미 있는 그릇이다. 원 4개가 한데 모여서 만들어지는 무늬인 쿼터 포일은 건축 양식이나 장식 예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로 네잎클로버를 생각하면 된다. 쿼터 포일 와토 접시가 나에겐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마이센 도자기에 화려함을 입히다, 드레스덴 Dresden 드레스덴 그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 마이센과 자주 혼동되는 드레스덴 도자기. 그도 그럴 것이 드레스덴에서 채색한 도자기의 베이스는 마이센의 백색 도자기였고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에는 마이센의 백 마크를 같이 사용하기도 했었다. 드레스덴의 초기 백 마크인 AR 마크와 파란 쌍검 마크는 1886년 마이센의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이후 드레스덴은 알파벳 D와 크라운 마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채색 작가들에겐 어떤 백 마크를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헬레나 볼프존도 마이센의 AR 마크를 사용하다가 마이센과의 소송에서 패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마이센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이니 마이센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후대에 사람들이 도자기의 가치를 물질적인 잣대로 평가하면서 브랜드명, 생산 연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는 제품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근본은 마이센과 같지만 각 작가의 개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드레스덴 도자기를 그릇 수집가의 입장에서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솔직히 앤티크 그릇 마켓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마이센의 대용품으로서 그릇쟁이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드레스덴을 이야기할 때 ‘마이센 대신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마이센이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이 문을 열면서 유명해진 도시라면, 독일의 예술·문화의 중심지였던 드레스덴은 이미 완성형 도시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실력파 작가들이 크고 작은 채색 공방을 열어 자신만의 예술성을 확립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드레스덴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자기 브랜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센터피스, 천사 샬레와 네발 샬레 Porzellan Putten-Schale 학창 시절, 과학 실험실에서 한 번쯤 봤던 샬레(schale)는 독일어로 움푹 팬 접시,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드레스덴 그릇을 보다 보면 ‘네발 샬레, ‘천사샬레라는 이름을 종종 듣게 되는데 특정 브랜드나 라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릇의 형태를 부르는 말로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릇을 생산하고 있는 카를 티메 드레스덴의 SP 드레스덴 백 마크를 가진 천사 샬레는 크기별로, 스타일별로 모두 갖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릇이다. 드레스덴 카를 티메의 가장 큰 특징인 화려한 꽃 장식과 색채, 골드 장식이 이 샬레에서도 잘 드러나며 로코코와 바로크,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장식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샬레를 받치고 있는 세 명의 아기 천사인 푸토(putto, 아기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는 빨간 볼과 포동포동한 살집이 귀엽게 잘 묘사되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 봉봉 볼(bonbon bowl)처럼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을 담아 식탁 위에 센터피스 삼아 놓으면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독일의 여느 가정집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그릇이 주는 힘이 아닐까. 보유 중인 또 다른 샬레는 다리가 네 개 달려 있고 푸토와 꽃까지,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그릇을 뒤집어 보면 아래쪽 디테일도 좋아서 세웠다가 뒤집었다가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질리지 않는다. 다만 꽃 장식이 섬세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발이 달려 있어 적층 보관은 힘들어 전용 그릇장에 따로 보관하는 중이다.
드레스덴의 마스터피스, 레이스 피겨린 Lace Figurine 마이센에서 1709년 경질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드레스덴 지역에는 도자기 공장은 없었지만 마이센 도자기를 장식하는 수많은 채색 공방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채색 공방의 예술가들이 애용하는 가장 유명한 기법 중 하나가 레이스 피겨린이었다. 피겨린(figurine)은 도자기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 인형을 뜻하며, 주로 테이블 위 센터피스로 사용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드레스덴의 도자기나 피겨린은 곧 마이센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실제로 정교하게 만든 레이스 피겨린 작품은 드레스덴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이 더 많다. 드레스덴은 유독 전쟁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므로 숨만 쉬어도 깨진다는 드레스 피겨린이 드레스덴에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외교 선물 등으로 유출되었던 제품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레이스 피겨린은 드레스덴 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직접 선물 받은 것이다. 높이가 각각 4cm, 7cm일 정도로 매우 작지만 그 어떤 대형 작품보다 나에게는 의미가 깊다. 레이스 피겨린을 직접 만들어본 후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알기에 이 작은 인형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레이스 피겨린 만드는 방법은 섬유 레이스에 흙물을 입히고 이 레이스를 한 땀 한 땀 주름을 잡아 인형에 붙인다. 꽃과 리본 등 디테일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시킨 후 1,200°C 이상 고온에서 구우면 섬유인 레이스는 모두 타고 흙물만 남는다. 1차 소성 후 유약을 바르고 얼굴을 그리는데 이건 더 어렵다. 작은 실수로도 레이스가 깨질 수 있으니 긴 붓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눈, 코, 입을 그려 넣어야 한다. 레이스 피겨린을 보면 얼굴 표정이 제각각이고 때로는 이목구비가 조금 ‘못생긴 인형을 만나기도 하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저 100년의 세월을 담담하게 견디고 레이스를 온전하게 지켜낸 ‘이 쪼꼬미들이 고마울 뿐이다.
UNITED KINGDOM 영국 왕실이 사랑한 그릇 로열 크라운 더비 Royal Crown Derby 어머니들의 로망이었던 영국 그릇 앤슬리 Aynseley 그릇에 무심했던 친정어머니의 그릇장에도, 그릇을 좋아했던 시어머니의 그릇장에도 존재감을 뽐냈던 그릇이 하나 있다. 강렬한 원색에 먹음직스러운 과일 문양이 돋보였던 앤슬리의 오처드 골드(Orchard Gold)가 그것. 1970~1980년대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의 영향으로 외국산 그릇이 국내에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화려한 앤슬리가 단연 눈에 띄었을 것이다. 국내 도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컬러와 패턴이었기에 더욱더 어머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그때 그 시절 어머니들의 마음을 훔친 앤슬리는 한 영국인의 취미에서 비롯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1700년대 영국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 지역 탄광의 회장이었던 존 앤슬리(John Aynsley)는 도자기 수집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점토공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1775년 롱턴(Lonton)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도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의 열정과 도자기 기술이 시너지를 내며 앤슬리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존 앤슬리는 도예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아들인 제임스(James) 역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유지했으며 1861년 제임스 앤슬리의 아들인 존 앤슬리 2세(John Aynsley II)는 가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공정을 도입했다. 그는 50%의 석회화된 골재를 도자기에 넣어 더 강하고 더 하얀 ‘본차이나를 만들었다. 이러한 본차이나의 높은 품질은 독특한 패턴과 더불어 앤슬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앤슬리는 자국과 해외에서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후대에 더 사랑받는 앤슬리의 작가들 오리엔탈 감성의 티 세트, 펨브로크 Pembroke 펨브로크의 찻잔만 갖고 있는 시어머니께 티 세트를 만들어 선물할 목적으로 티포트, 커피포트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대가족이 되어버렸다. ‘그릇 운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운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변명이라면 변명이다.
앤슬리 펨브로크는 18세기 아시아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패턴으로 영국 펨브로크 지방의 도자기를 좋아하던 펨브로크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패턴은 컬러풀한 꽃무늬와 그릇의 중앙에 위치한 새가 특징인데, 그러고 보니 꽃과 새를 그린 우리나라 화조도(花鳥圖)와도 많이 닮아 있다. 전반적인 톤이 웨지우드 찬우드(Charnwood) 패턴과도 비슷한데 찬우드는 새가 아닌 나비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릇이 여러 개이다 보니 각각의 포트, 찻잔의 꽃과 새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DENMARK 명불허전 덴마크 대표 포슬린 로얄코펜하겐 Royal Copenhagen 로얄코펜하겐 심벌의 비밀 브랜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얄코펜하겐은 덴마크 왕실의 든든한 후원 아래 250여 년 동안 최고의 도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는 브랜드 로고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로고의 왕관 문양은 왕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왕관 아래 세 개의 물결무늬는 덴마크를 지나는 세 개의 해협을 의미한다.
엘레강스 스타일의 표본, 팬 서비스 골드 Fan Service Gold 컬렉터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희귀한 아이템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한 듯 혈압이 마구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좋아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앞두고 입안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과도 비슷하다. 코발트 컬러 일색인 로얄코펜하겐 제품만 보다가 팬 서비스 골드를 처음 봤을 때 내 기분이 딱 그랬다.
팬 서비스는 로얄코펜하겐의 전설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아놀드 크록(Arnold Krog)이 디자인한 그릇으로 화이트, 블루, 골드 세 가지로 출시되었으며 그중 골드가 가장 상위 버전이다. 팬 서비스 골드는 그릇마다 3cm 정도 되는 두꺼운 골드 라인이 둘러져 있고, 커피포트와 찻잔의 손잡이에는 골드 리스가 장식되어 있어 그야말로 부티가 줄줄 흐른다. 다만 이러한 골드포인트는 무광 처리되어 ‘블링블링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은은한 럭셔리에 가깝다.
굳이 흠을 찾자면 전체 그릇 볼륨에 비해 손잡이가 너무 작다는 것. 유럽 차 문화에서는 찻잔을 잡을 때 손가락을 손잡이에 걸지 않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살짝 잡는 것이 올바른 에티켓이다.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에 찻잔 손잡이에 손가락을 거는 것이 마치 옆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처럼 보여서 이와 같은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백 마크를 보면 1969년에 생산된 것이며 리스 장식으로 추측하건대 크리스마스 디너용으로 출시된 것이 아닐까 싶다. 패턴명을 들으면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한 그릇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서비스(service)는 독일어로 식기 세트라는 의미이다. ‘팬 서비스이건 ‘팬 식기 세트이건 나 같은 그릇쟁이들에게 선물인 것만은 확실하다.
겨울에 피는 꽃, 빙앤그렌달 크리스마스 로즈 Christmas Rose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미당 서정주의 시를 노래한 가수 송창식의 목소리가 절로 생각나는 쨍한 파란색이 돋보이는 그릇이다. 제품명이면서 패턴의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로즈는 헬레보루스(helleborus)라고도 불리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눈장미 또는 ‘겨울장미 등의 애칭을 갖고 있다. 식물의 줄기와 잎은 로얄코펜하겐의 시그니처 컬러인 코발트블루로, 꽃잎은 입체감 있는 화이트 컬러로 표현했고 배경은 빙앤그렌달만의 그러데이션 채색 기법을 사용했다. 꽃만 봤을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지만 혹독한 추위에도 언 땅을 뚫고 나올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외유내강의 크리스마스 로즈를 로얄코펜하겐 스타일로 잘 해석했다는 생각이 든다. 청량한 컬러 때문인지 여름에 주로 애용하는 그릇인데 블루 컬러의 다른 라인 제품과 믹스앤 매치해도 잘 어우러진다.
FRANCE 프랑스의 자존심 세브르 Sèvres 마이센의 아성에 도전하는 세브르 유럽 경질 자기의 역사는 중국 청화 백자를 모방하면서 시작됐기에 푸른색을 좋아하는 내가 앤티크 그릇 수집가가 된 것은 필연이 아닐까 싶다.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 블루, 그중에서도 짙은 물빛의 푸른색, 바로 터키블루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는 세브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블루 셀레스트(bleu celeste)와 궤를 같이한다. 세브르 그릇은 나의 워너비 컬러 그 자체이므로 수집 리스트의 상단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워낙 고가여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 아이템이기도 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등 어느 나라 박물관을 가도 눈이 부시게 파란 터키블루의 세브르 그릇은 항상 있었다. 자꾸 보면 질릴까 싶어 파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밥 먹듯이 박물관을 드나들며 세브르 그릇에 눈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갈망이 더 커져 결국 내 그릇장을 채우게 됐다.
1709년 독일 작센 공국 마이센에서 경질 자기를 생산하던 시기에 프랑스 샹티이(Chantilly) 지방에서는 연질 자기인 파이앙스(faience)를 생산하고 있었다. 1740년 루이 15세(Louis Xv)와 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Jeanne Antoinette Pisson)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파리 외곽의 뱅센(Vincennes) 지역에 도자기 공장을 열면서 세브르의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이 제조소의 목적은 마이센에 필적하는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756년 공장을 세브르 지방으로 옮긴 후 세브르 국립 도자기 제조소(Manufacture nationale de Sèvres)로 이름을 바꿨고, 1768년 리모주(Limoges)에서 고령토를 발견해 1770년 이후 마침내 경질 자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경질 자기 개발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마이센보다 50년 이상 뒤처지긴 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로코코 양식을 세브르 도자기에 온전히 투영시킨 것을 보면 연질 자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던 프랑스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3대 도자기로 우뚝 서다 퐁파두르 부인의 미적 감각은 세브르 도자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특히 당대 유행하던 살롱 문화의 필수 아이템인 실내 장식용 도자기와 만찬용 식기 세트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왕실 제정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제작된 화병에서 황동 장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 장인들이기에 가능한 요소였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독일 도자기는 흰색 그릇에 패턴을 새긴 것이 전부였다면, 프랑스 자기는 발굽이나 황동 등의 장식을 더해 한껏 멋을 부렸다. 세브르의 트레이만 보더라도 몰딩 처리한 것처럼 황동 장식이 트레이의 가장자리에 빙 둘러져 있는데 얼마나 멋스러운지 모른다.
이처럼 세브르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 꽃 장식과 금장을 더한 다채로운 패턴, 유니크한 블루 셀레스트 컬러를 만들어내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세브르 도자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은 전원, 귀족들의 모습, 꽃, 새, 과일 등으로 화가 프랑수아 부셰(François Boucher), 조각가 오귀스탱 파주(Augustin Pajou) 등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로코코 양식의 대가가 대거 참여해 작품을 완성했다. 1800년 나폴레옹은 화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알렉상드르 브롱니아르트(Alexandre Brongniart)를 세브르의 감독으로 임명해 47년간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세브르 공장에서는 화병과 테이블 센터피스와 같은 큰 장식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외교 선물 용도였다.
한편 오늘날에도 세브르는 프랑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도제식으로 장인을 키우고 있으며, 도자기 페인팅을 하는 정식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세브르 공식 홈페이지(www.sevresciteceramique.fr/)가 박물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세브르 도자기가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판매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제작 중단과도 같은 것이기에 가격은 점점 더 높게 형성될 것이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점점 더 구하기 힘든 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은 ‘로또 일등에 당첨된다면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릇을 잔뜩 사야지. 하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그릇장 가득 세브르 그릇으로 채우는 상상도 해보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 세브르. 앤티크 그릇을 수집한 지 30년이 지나니 이러한 감정이 마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자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