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눈 속에 사는 사람 | |||
| 지은이 : 김정태 (지은이) | ||||
| 출판사 : 체인지업 | ||||
| 출판일 : 2024년 07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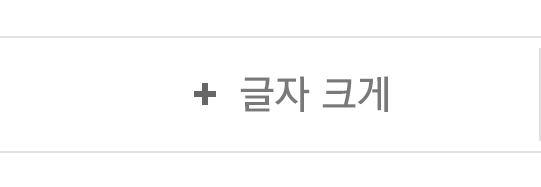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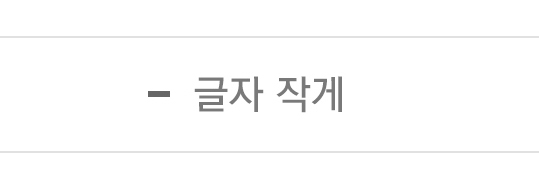 |
 |  |
■ 책 소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지탱해 온 사유의 힘, 천만 배우 김정태의 ‘첫 시집’
30년간 쓰고 모은 시(詩) 마흔일곱 편 수록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에서 ‘도루코’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후 여러 작품에서 괄목할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정태…. 습작과 연기를 병행하며 숱한 삶의 고난과 마주한 김정태는 어려서부터 시인을 꿈꿨다. 부잣집 아들을 동경하며 단지 새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갖고 싶었던 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사랑에 목말랐던 아이.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과 성인이 된 이후의 쓰라린 삶을 꾹꾹 눌러 담아 첫 시집을 펴낸다. 아들이자 아버지인, 남자이자 남편인, 배우이자 시인인 한 인간의 첨예한 시적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첫 시집은 설렘으로 가득하기 마련이지만 김정태의 시는 왠지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총 3부로 구성된 김정태의 첫 시집은 고통과 가난, 한 개인의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단 몇 문장만으로도 ‘사랑’의 온기를 직감해 낼 수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이나 공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김정태는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기어서 왔다. 꿈틀거리며 왔다. 그와 그의 시는 이런 방식으로 오래도록 독자들 곁에서 생동할 것이다.
■ 저자 김정태
본명은 김태욱이다.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1999년 영화 《이재수의 난》으로 데뷔 후 곽경택 감독의 《친구》, 《똥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연기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이환경 감독의 《7번방의 선물》은 그가 주연한 첫 천만 관객 영화다. 시집 《내 눈 속에 사는 사람》을 썼다.
■ 차례
시인의 말
1부 사랑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니었던
나에게 늘 필요했음을|중학교 1학년|형에게|다시 형에게|이 밤 그리고 내일 아침|After The Storm|통영|신선대 산복도로|구포역|계속 있는 사람|마르고 젖는 동안|비밀|여름이 아는 이별|진아|직립보행의 계절
2부 나의 아카이브, 바다
여수|물결과 생채기|코펜하겐|서커스의 제왕|낮잠|신혼 1|신혼 2|신혼 3|신혼 4|범냇골 하동상회 셋째|광안리|조빔을 듣는 밤|J에게|앙각|너는 반송(盤松)되어 온다|다른 여름
3부 천사는 아직 너무 어려서
큰애|작은애|레지스탕스의 고백|여기 밤비|각자의 샤넬라인|후쿠오카 1|후쿠오카 2|심장보다 고마운|당신을 닮는다는 것|수묵(水墨)||우리는 지금 몇 시입니까|동대신동 와병인 1|동대신동 와병인 2|동대신동 와병인 3|풍기|눈을 감고
 |  |
 |

김정태의 첫 시집은 그의 30년간의 삶과 경험을 담아낸 작품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쌓아온 깊은 사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영화 《친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가,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쓴 마흔일곱 편의 시는 유년 시절의 아픔과 성인 이후의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사는 사람
사랑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니었던 중학교 1학년 80번 버스를 타면 사직동 미남로타리 아니, 멀어도 온천장이면 학생들이 거의 다 내렸다
부산대 지날 무렵 매콤한 최루탄 냄새 돌멩이처럼 차를 두드려 자동적으로 창문 닫게 하고 레미콘 공장을 지나 다시 빵집과 약국을 지나 지산간호대학 담벼럭을 쭉 따라 올라가면 언덕 맨 위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 길에 나는 책가방만 한 시커먼 이스라엘 잉어가 있던 향어집 수족관 안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좋았다
다 집에 가고 없는 토요일 정오 간호대학 등나무 쉼터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흘러나오면 오르락내리락했던 나의 동네
어느 날은 학교에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공장 다니던 주인집 누나의 새하얀 프로스펙스 운동화 구겨 신고 학교 갔다가 개 맞듯이 맞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사춘기가 안 왔다
부평동 카바레 부도나고 송도 혈청소로 피신했다가 또 그 정반대인 부곡동 끄트머리에 들어앉아 나는 너무 가난해서
큰형이 다니던 중학교에 가서도 나는 계속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키가 커지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 최악의 가난뱅이 학생 뒷산 끄트머리 바위에 앉아 아버지께서 읽어주시는 이광수의 『무정』을 듣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듣다가 책의 감동도 집안을 다시 일으킬 해법도 무엇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오면 주인집에서 키우던 누렁소와 참 많이도 울었다
그 누렁소 불법 도축으로 죽고 그때 그 누렁소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길게 휜 소나무숲을 동생과 내려가며 부잣집 얘기를 했지 부잣집 아들 얘기를 했지
이제 없는 그 집, 온천장 삼계탕집에서 일당 오천 원 벌고 온 엄마와 약국에서 PM무좀약 사 들고 길이 아닌 길을 한참 올라야 했던 그 집
소와 함께 잠시 살았던 그때가 소의 목숨처럼 아슬아슬했던 그때가 1985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형에게 먼길을 돌아 비 내리는 숲길에 쓰러진 너는 수십 년 전 나와 피를 나누고 밥을 나누며 엄마 젖 밑에서 커 온 형제
그런 너는 많이 아프구나 나는 찢어지는 듯하구나 먼길을 돌아 숨소리도 약한 너는
기별도 없이 털이 빠지고 이별의 도장 손에 쥐고 그래 그래 내가 어떻게 해 줄까
어느 날의 저녁엔 앰뷸런스 타고 나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 자리 다른 너를 병실에 눕혔다 네 속에서 타들어 간 외로움 덩어리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 안 해도 우리는 괴롭게도 형제인데 살래 살고 싶제 살자 이래 돌고 돌아와도 품어줄 이 없는 새해지만 살자 그래 울어서 미치더라도 살자
축복해 줄 이 없는 그런 생이 남았더라도 너를 지게에 지고 산 움막에 넣어 내가 밥을 나르더라도 살자 발도 씻겨 줄게 옷도 사 줄게 약이 온몸을 돌고 돌아 제가 살아난 것처럼 살게 해 주세요
저와 비슷한 형이니까 저와 비슷한 형을 주셨으니까 신의 하수인이 되겠습니다
잠들고 잠들어 깨고 또 깨면 누가 봐도 형제야 울지 말고 형제야 우리 살자 그래 산다 우리는 오래된 형제 오래된 슬픔 형제야 깊게 쉬어라 그래 살자
신선대 산복도로 신선대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쏟아지는 햇살 털며 신선대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내려오면 천주교 공동묘지의 많은 비석이 보인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플란넬 셔츠처럼 회색 비석 멋지게 세워두고 오래오래 벗 되는, 그 길 사이를 걷다 보면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것이다.
가난이 나를 멍하게 하던 그때, 나는 언제나 오묘해져서 아침과 밤을 삼교대로 번갈아 살면서 삶은 조무래기 손장난 같은 거라고 외쳤는데, 줄 그어진 주차장이 유일한 질서였던 한낮. 혼자 거길 걷기엔 어쩐지 기분이 야릇하기도 했다. 한 평 아니면 반 평, 공평한 죽음이 부러웠고 볕 뜨거워지면 죽음도 잠시 사라지는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살짝 튼 공동묘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은 소록도 가기 전, 이 언덕 이 바람 용호동 끝에 모였다지. 대파와 토끼와 지렁이를 마구잡이로 쪼아대던 수탉과 흙내 나던 이별은 용호농장 쪽으로 더 내려가면 들리려나. 나에게는 십 년 전과 오늘이 한날 같아서 모든 기억이 솔잎처럼 뽀족하다.
눈부신 오륙도 앞. 저 멀리 회색 함선 두 척이나 가진 바다는 듬직하기도 하겠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나의 아카이브, 바다 신혼 4 비바람 불던 날 빨랫줄에 앉은 빗방울을 세던 우리 미셸 페트루치아니 몇 곡에 점심밥도 잊었지
쓸쓸한 가을이면 이 동네만큼 묵은 된장이며 막 버무린 냉동 가오리무침 그리고 붕장어 굽는 냄새와 어깨동무하고 우룡산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았다
유별났던 그해 태풍 힘겹게 견딘 낡은 방충망을 구석구석 드나들던 그 바람들과 기꺼이 가을의 잠을 자기도 했지
집 앞 구세군 교회와 그 바로 뒤 암자에서 들려오는 은총과 백팔 번뇌가 우리의 이부자리와 뒤섞이기도 했던 그때 우리를 구원해준 건 무엇이었나
나이 든 신랑 각시 신혼의 단꿈은 사라진 지 오래인 그 겨울 지나 다시 봄을 지날 무렵
천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수묵(水墨) 내 육신 잠들 때 너를 향한 그리움도 나를 향한 위로도 아주 수고스럽게 해 왔음을 알게 된다
손톱만 한 싹 몇 방울 빗줄기에 몸을 세우던 오후
말없이 저녁을 보내온 내 모든 염려가 내 옆에 가만히 눕는다
이렇게 누워 나와 상관없는 밤하늘 바라볼 때
어쩌면 이 하루를 손에 쥐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사랑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니었던 중학교 1학년 80번 버스를 타면 사직동 미남로타리 아니, 멀어도 온천장이면 학생들이 거의 다 내렸다
부산대 지날 무렵 매콤한 최루탄 냄새 돌멩이처럼 차를 두드려 자동적으로 창문 닫게 하고 레미콘 공장을 지나 다시 빵집과 약국을 지나 지산간호대학 담벼럭을 쭉 따라 올라가면 언덕 맨 위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 길에 나는 책가방만 한 시커먼 이스라엘 잉어가 있던 향어집 수족관 안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좋았다
다 집에 가고 없는 토요일 정오 간호대학 등나무 쉼터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흘러나오면 오르락내리락했던 나의 동네
어느 날은 학교에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공장 다니던 주인집 누나의 새하얀 프로스펙스 운동화 구겨 신고 학교 갔다가 개 맞듯이 맞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사춘기가 안 왔다
부평동 카바레 부도나고 송도 혈청소로 피신했다가 또 그 정반대인 부곡동 끄트머리에 들어앉아 나는 너무 가난해서
큰형이 다니던 중학교에 가서도 나는 계속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키가 커지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 최악의 가난뱅이 학생 뒷산 끄트머리 바위에 앉아 아버지께서 읽어주시는 이광수의 『무정』을 듣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듣다가 책의 감동도 집안을 다시 일으킬 해법도 무엇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오면 주인집에서 키우던 누렁소와 참 많이도 울었다
그 누렁소 불법 도축으로 죽고 그때 그 누렁소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길게 휜 소나무숲을 동생과 내려가며 부잣집 얘기를 했지 부잣집 아들 얘기를 했지
이제 없는 그 집, 온천장 삼계탕집에서 일당 오천 원 벌고 온 엄마와 약국에서 PM무좀약 사 들고 길이 아닌 길을 한참 올라야 했던 그 집
소와 함께 잠시 살았던 그때가 소의 목숨처럼 아슬아슬했던 그때가 1985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형에게 먼길을 돌아 비 내리는 숲길에 쓰러진 너는 수십 년 전 나와 피를 나누고 밥을 나누며 엄마 젖 밑에서 커 온 형제
그런 너는 많이 아프구나 나는 찢어지는 듯하구나 먼길을 돌아 숨소리도 약한 너는
기별도 없이 털이 빠지고 이별의 도장 손에 쥐고 그래 그래 내가 어떻게 해 줄까
어느 날의 저녁엔 앰뷸런스 타고 나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 자리 다른 너를 병실에 눕혔다 네 속에서 타들어 간 외로움 덩어리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 안 해도 우리는 괴롭게도 형제인데 살래 살고 싶제 살자 이래 돌고 돌아와도 품어줄 이 없는 새해지만 살자 그래 울어서 미치더라도 살자
축복해 줄 이 없는 그런 생이 남았더라도 너를 지게에 지고 산 움막에 넣어 내가 밥을 나르더라도 살자 발도 씻겨 줄게 옷도 사 줄게 약이 온몸을 돌고 돌아 제가 살아난 것처럼 살게 해 주세요
저와 비슷한 형이니까 저와 비슷한 형을 주셨으니까 신의 하수인이 되겠습니다
잠들고 잠들어 깨고 또 깨면 누가 봐도 형제야 울지 말고 형제야 우리 살자 그래 산다 우리는 오래된 형제 오래된 슬픔 형제야 깊게 쉬어라 그래 살자
신선대 산복도로 신선대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쏟아지는 햇살 털며 신선대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내려오면 천주교 공동묘지의 많은 비석이 보인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플란넬 셔츠처럼 회색 비석 멋지게 세워두고 오래오래 벗 되는, 그 길 사이를 걷다 보면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것이다.
가난이 나를 멍하게 하던 그때, 나는 언제나 오묘해져서 아침과 밤을 삼교대로 번갈아 살면서 삶은 조무래기 손장난 같은 거라고 외쳤는데, 줄 그어진 주차장이 유일한 질서였던 한낮. 혼자 거길 걷기엔 어쩐지 기분이 야릇하기도 했다. 한 평 아니면 반 평, 공평한 죽음이 부러웠고 볕 뜨거워지면 죽음도 잠시 사라지는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살짝 튼 공동묘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은 소록도 가기 전, 이 언덕 이 바람 용호동 끝에 모였다지. 대파와 토끼와 지렁이를 마구잡이로 쪼아대던 수탉과 흙내 나던 이별은 용호농장 쪽으로 더 내려가면 들리려나. 나에게는 십 년 전과 오늘이 한날 같아서 모든 기억이 솔잎처럼 뽀족하다.
눈부신 오륙도 앞. 저 멀리 회색 함선 두 척이나 가진 바다는 듬직하기도 하겠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나의 아카이브, 바다 신혼 4 비바람 불던 날 빨랫줄에 앉은 빗방울을 세던 우리 미셸 페트루치아니 몇 곡에 점심밥도 잊었지
쓸쓸한 가을이면 이 동네만큼 묵은 된장이며 막 버무린 냉동 가오리무침 그리고 붕장어 굽는 냄새와 어깨동무하고 우룡산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았다
유별났던 그해 태풍 힘겹게 견딘 낡은 방충망을 구석구석 드나들던 그 바람들과 기꺼이 가을의 잠을 자기도 했지
집 앞 구세군 교회와 그 바로 뒤 암자에서 들려오는 은총과 백팔 번뇌가 우리의 이부자리와 뒤섞이기도 했던 그때 우리를 구원해준 건 무엇이었나
나이 든 신랑 각시 신혼의 단꿈은 사라진 지 오래인 그 겨울 지나 다시 봄을 지날 무렵
천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수묵(水墨) 내 육신 잠들 때 너를 향한 그리움도 나를 향한 위로도 아주 수고스럽게 해 왔음을 알게 된다
손톱만 한 싹 몇 방울 빗줄기에 몸을 세우던 오후
말없이 저녁을 보내온 내 모든 염려가 내 옆에 가만히 눕는다
이렇게 누워 나와 상관없는 밤하늘 바라볼 때
어쩌면 이 하루를 손에 쥐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
* *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jpg)
.jpg)
.jpg)

